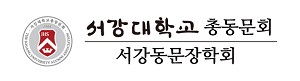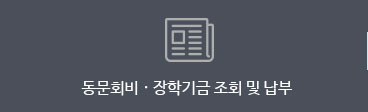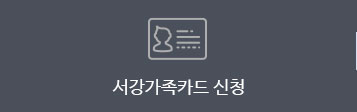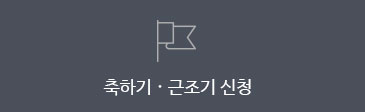김미자(64국문)동문 등단, 현대수필 신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03 10:21 조회11,269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김미자(64 국문) 전 총동문회 사무국장이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김미자 동문은 계간 현대수필 73호(2010 봄)에서 ‘살아있음의 환희’라는 작품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인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명이인 수필가가 먼저 등단해 본명 대신 필명을 '금련화'로 지었습니다.
서초수필문학회 회원으로서 필력을 가다듬어 온 김 동문은 “글을 쓴다는 것이 그저 이루지 못할 꿈으로만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글을 써 보겠다는 용기를 더해 준 선배 한 분과 동기 한 친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만났던,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동문의 양해와 현대수필 측의 허가를 얻어 신인상 수상작 전문을 게재합니다.
<살아있음의 환희>
금련화(본명 김미자, 64 국문)
cathymija@hanmail.net
근 두 주일 동안 눈 때문에 고생을 하였다.
신체의 한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은 마음까지도 우울하고 서글프게 만든다. 붉게 부어올라 햇빛을 보면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시리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보기가 흉해 색안경을 써야만 했다.
손으로 아픈 눈을 가리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던 어느 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한쪽 눈을 붙잡고 컴퓨터를 두드릴 만큼 절대 절명의 일이 내 앞에 있는 것일까. 이 불편을 위해 휴식의 시간을 허락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달력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약속의 글자들, 그 글자들을 따라 허겁지겁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는 숨 가쁨은 채워지지 않는 가슴 속 공허함을 채워 보려는 안간힘은 아닐까. 누구나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삶의 대열에서 행여 이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 제목이 생각난다.
사소한 것은 무엇이고 소중한 것은 또 무엇일까. 어쩌면 이 두 문제는 살아있는 날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화두일지도 모른다.
안과를 드나들다 보니 눈에 약간씩 차도가 생겼다.
슬프고 우울하던 마음도 약간씩 회복이 되었다. 몸과 마음이 하늘의 구름이 걷히듯 밝아지던 지난 토요일, 오랜만에 외국에서 다니러 온 친구와 함께 연극 공연을 다녀왔다.
-「19 그리고 80」- 이 작품은 죽음을 동경하는 19세의 청년과, 순간 순간 경이로움과 사랑으로 삶과 마주하는 80세 할머니와의 사랑 이야기다.
19세 청년의 끊임없는 죽음에의 동경은 80세 할머니의 삶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속에서 변화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마주하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라고 - 노을의 아름다움, 피어오르는 꼿송이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 밤하늘의 영롱함, 드넓은 대양의 푸름, 날아가는 새의 날갯짓, 밝아지는 촛불, 아름다운 음악 속의 흥겨운 몸놀림, 가슴을 따뜻이 데워주는 붉은 포도주 한잔 - 우리에겐 인생을 즐겁게 장식해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지 않은가’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두 시간 후, 어두운 극장을 나올 때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절망하지 않는 그 영혼을 보고 나온 상쾌함으로 인해, 날개 짓이라도 하며 하늘이라도 퍼덕이며 날고 싶었다. 토요일 오후의 대학로는 젊음의 생기와 화창한 봄볕으로 인해 풋풋한 싱그러움이 가득했다. 봄볕은 따스하고, 친구와 마시는 커피 한잔도 향기로웠으며 마음까지 깃털처럼 가벼웠다.
난 이제, 간밤의 비바람과 뇌성이 걷힌 아침,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세상을 향해 가슴을 열어본다.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숨을 깊게 쉬어 본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사소한 것에 행복해하기도 하니, 이만하면 인생은 살아있음의 환희가 아닌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