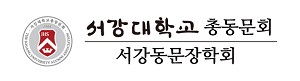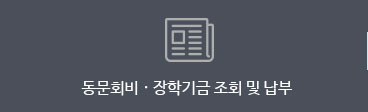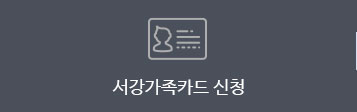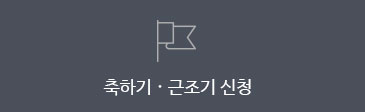故장영희(71 영문) 10주기 #3.문학의 힘을 보여주신 선생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2 10:14 조회22,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글 목록
#1.여전히 제 안에 살아 계신 선생님 : 왕선택(84 영문) YTN 기자
#2.내 인생의 나침반 : 한정아(88 영문) 번역가
#3.문학의 힘을 보여주신 선생님 : 정원식(92 영문) 경향신문 기자
#4.늦된 제자의 고백 : 이미현(96 사학) 프리랜서 에디터
#5.‘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신 ‘나의 선생님’ : 이남희(98 영문) 채널A 정치부 차장
영문과 대학원에 입학했던 2000년 1학기 <19세기 미국소설> 시간이었던 것 같다. 사진 속 사람들의 옷차림새를 보니 계절은 봄인 게 분명하다. 나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사람은 정중앙의 장영희 교수님이시다.
교수님에 대한 추억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한 것을 한동안 후회했다.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해 도합 6년 넘게 영문과를 다녔지만 정작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건 <19세기 미국소설>이 전부다.
학부 시절 장영희 교수님 수업은 과제가 많기로 유명해서 나처럼 게으른 학생에게는 기피 대상이었다. 이미 입학할 당시부터 서강대 영문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 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수업을 듣지 않으니 실제로 마주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전공 수업으로만 채워진 대학원에서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 않을 수 없어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강의실은 교수님이 뿜어내는 유쾌하고 강렬한 에너지로 충만했다.
나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말의 속사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간혹 전혀 생각지도 못한 코멘트를 던지시기도 했다.
한번은 내게 “얘, 넌 꼭 물리학과 학생 같아”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 시절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면 별 특징 없는 옷에 얼굴마저 무표정해서 무척 딱딱해 보이긴 했다.
강의 시간에 분명 호손, 멜빌, 트웨인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었을 텐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작가와 작품이 아니라 ‘휘뚜루마뚜루’라는 단어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강의를 듣고 있던 15명 중에서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전을 보면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우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엄연히 표준어로 등재돼 있지만 당시의 나는 ‘어느 지방 사투리일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2001년부터는 과사무실에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을 뵙게 됐다. 과사무실에서 일하는 조교들은 장영희 교수님의 차가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X관 앞으로 들어오면 항상 서둘러 나갔다. 차문을 열고 교수님이 내리시는 동안 차 안에 있는 교수님의 물건들을 챙겨 연구실로 옮겨놓는 게 조교들의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2001년 한 해 동안 조교 생활을 했으니, 강의는 듣지 않았지만 두 학기 정도는 교수님을 꾸준히 뵈었던 셈이다.
벌써 십 몇 년 저쪽의 일이어서 그런지, 교수님이 목발에 의지해 X관 로비를 지나 연구실까지 들어가는 짧은 시간 동안 옆에 있던 조교들에게 했던 말들이 일일이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교수님을 떠올리면 항상 사진 속의 모습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생각난다. 어쩐 일인지 나는 단 한 번도 교수님의 찡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만 같다. 단순한 시간의 미화 작용인 걸까.
교수님의 실제 삶이 온통 웃음으로만 덮여 있었을 리 없다. 좋은 번역서를 남긴 서강대 영문과 교수이자 탁월한 에세이스트였으니 공부하는 학인이자 작가로서는 분명 성공한 삶이었겠지만, 생활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불편은 나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동에서부터 인간적 대우의 차원에서까지, 한국 사회는 장애 등 소수자의 표식을 지닌 사람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우울하기만 했을 리도 없다.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투적인 틀로 타인의 삶을 규정한다. 유작이 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보면 어떤 잡지가 인터뷰 기사 제목을 ‘신체장애로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라고 지어놓은 걸 보고 교수님이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형’이라고 부르는가”라며 분노하는 대목이 나온다.
교수님께서는 삶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그리고 그 힘은 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다. 교수님의 책들이 여전히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러한 믿음이 책 갈피갈피에 깊숙이 스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원식(92 영문) 경향신문 기자

* 글 목록
#1.여전히 제 안에 살아 계신 선생님 : 왕선택(84 영문) YTN 기자
#2.내 인생의 나침반 : 한정아(88 영문) 번역가
#3.문학의 힘을 보여주신 선생님 : 정원식(92 영문) 경향신문 기자
#4.늦된 제자의 고백 : 이미현(96 사학) 프리랜서 에디터
#5.‘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신 ‘나의 선생님’ : 이남희(98 영문) 채널A 정치부 차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