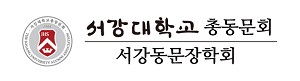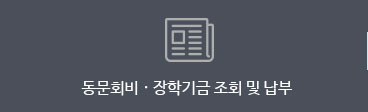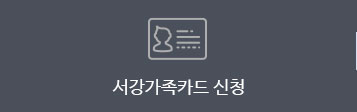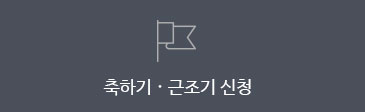좋은 이웃 첫번째 이야기 - 조순실(76.사학) 들꽃청소년세상 공동 대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진아 작성일06-06-27 17:27 조회13,1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비바람 맞던 들꽃들, 안길 곳을 찾다
들꽃은 이름이 없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에게 우리는 이름을 다 붙여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참 세상은 인색하다. 이미 이름 지어진 꽃들만을 가꾸고 보살핀다. 들꽃은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하고 거칠게 피어나고, 때로 사람들은 그런 들꽃의 근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한다.
들꽃청소년세상의 공동대표 조순실(76.사학) 동문은 이 들꽃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사회에 필요한 자원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것은 94년도였다. 목사인 남편과 함께 개척교회를 꾸리고 있는데, 아이들 몇 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본드를 불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들고양이처럼 거칠었고, 조순실 동문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지 낯설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을 사회복지시설에 보냈지만 아이들은 그 곳을 견뎌내지 못했다. 아이들이 도망쳐 나오고, 다시 시설에 들여보내기를 몇 차례, 조순실 동문은 생각했다. 혹시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실은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조순실 동문은 남편과 함께 안산에서 노동자를 위한 일을 했다. 대학 시절부터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내내 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탁아프로그램이나 노동 상담소 같은 것을 운영했다. 서슬 퍼런 시절에 겪었을 고초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길고 긴 군사정권이 끝나 다른 시설에 하던 일을 넘기고 목사인 남편과 본격적으로 교회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들꽃 같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발목이 잡혀버린 거죠. (웃음) 저는 아이들의 잠재성을 믿어요. 주도적으로 이 사회에서 큰일을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올바른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우리가 그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요."
들꽃청소년세상의 아이들은 그냥 모여서 지내는 게 아니라 가정의 개념으로 묶여 있다. 생활교사 2명과 일곱 명 이내의 아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쪽 부모가 없고 남아 있는 부모가 폭력을 쓰거나 무능력한 까닭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아이들에게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커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형태의 가정이 현재 11개가 되었고 들꽃청소년세상에서 이 가정들을 관리한다.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교육 문제도 절실해졌다. 10대의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96년도에 처음 근처 만화방에 학교처럼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게 지금의 대안학교인‘들꽃학교’로 발전했다. 현재 이 들꽃학교에는 30여 명의 교사와 7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한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들꽃학교를 키워오면서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이라 교회 안에서 계속 본드를 했다. 환각 상태에서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았고,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은 그대로 폭력을 물려받아 거칠게 굴었다.
“본드를 했던 아이들이 다 커서는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요. 어떤 녀석은 결혼해서 대형 마트에서 기저귀 사다가 저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참 대견하고 뿌듯하죠. 그게 꼭 제가 뭘 가르쳐서, 뭔가 도와줘서 아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아이들이니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들꽃청소년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가정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둥지를 틀지 못하고 들판에 외로이 방치되어 있다. 이곳의 운영은 기업들의 후원과 소액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매달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다.
“소액 후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요. 소액 후원이 있어서 IMF 때도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야 한다면 부담을 많이 갖는데, 정말 적은 액수라도 그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늘 생활해서일까. 들꽃학교를 운영하는데 힘이 들 법도 하건만 조 동문의 얼굴엔 사소한 그늘 한 점 보이지 않았다.
방인화(93·사학) 자유기고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